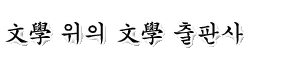|
|
|
--- |
|
文學위의 文學 출판사입니다. PDF로 전환하여 복사기로 책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인쇄'에서 확인해 보세요! |


2-1. 제주도의 똥돼지 (2007/11/13)
2009.01.31 20:06

이 십 년 전의 그 날.
나는 군인으로, 제주도에서 2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다.
일요일이여서 외출하여 잔뜩 기대를 하고 찾아 간 곳은 서귀포 근처의 한 시골 민가(民家)였다. 군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모두들 꾸워 놓은 보릿자루일수 밖에...그렇지만, 우리들 일 곱 사람은 그곳에 초대를 받아 가는 것이었다. 우리 대원 중에 한 요원이 모처럼만에 같은 소속의 몇 사람을 추천하여 데리고 간 것이었다.
고만고만한 시골의 가옥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울타리를 치듯 주위를 막고 있는 돌담이었다. 지천(至賤)에 깔린게 돌이였으니까. 돌로 담을 쌓는게 뭐 대수겠는가! 그러나, 그 돌은 육지의 돌처럼 무겁고 암팡스럽게 각이 진 것은 아니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검은 돌인데, 아무리 커도 무겁지가 않았다. 그런 빛깔의 돌들이 경계 표시를 위해 밭 주위에 다른 곳과 연계하여 놓여 있는 구불거리는 풍경은 마치, 만리 장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덤 주위에도 이용되었는데, 묘지 주위에 빙 둘러쳐진 돌담은 제주도가 아니면 구경할 수 없으리라!
그날, 내가 기절초풍하게 놀란 바로 그 집도 예니 집처럼 다를바 없는 돌담으로 쳤고 문은 쌉작문이 아닌 긴 작대기를 가로 걸치게 만든 나무 받침대가 양쪽에 지게 받침처럼 뽀족하게 튀어 나와 있는 그런 얘기 속의 집이었다.
언듯 들은 말로 대문 기둥에는 세 개의 높이가 있어 가장 아래 쪽인 첫 째 칸에 나무 작대기가 걸쳐 있으면, 가까운 곳에 나가 있다고 한다던가? 둘 째 칸은 부인과 관계중이니 절대 만날수 없다는 뜻이라나 뭐라나? 그리고, 세 째 칸에 작대기가 걸쳐 있으면, 소와 가축을 많이 방목을 하기 때문에 뛰어 들어 오지 못하게 높은 탓에 멀리 가 있다는 표시라고 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전하여 들은 것도 같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나무로 된 상이 놓여 졌는데, 밖으로 비쳐 보이는 먼발치에 바닷가의 푸른 해안선이 바라 보였다. 이런 전경은 너무나 낭만적이었고 운치가 있었다. 단지, 앞서 말했 듯이 군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주는 대로 얻어 먹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보니 이것 저것 상에 음식이 차려지는 데, 닭고기가 보이고 돼지 고기가 보였다. 모두들 한 그릇 씩 삼계탕을 얻어 먹고 후식으로 수박을 쪼개 먹은 게 탈이었다.
갑자기 얻어 먹은 기름끼에 뱃속이 놀란 모양이다. 배가 땡기고 아픈 것이 금방 설사가 나올 판국이었다.
"저어,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았다. 그런데, 같은 동료들이 나보다 먼저 화장실에 갔다온 모양인데, 얼굴색이 새파랗다. 그리곤, 턱 끝으로 가르키는 곳은 마당 구석진 곳에 헛간 비슷하게 샌긴 나무 문이었다. 어둠침침한 그 곳에 귀신이라고 있는 것일까? 알려 주기는 해도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내용을 말하지 않을 때처럼 자뭇 꿀먹은 벙어리다.
"저쪽인데요. 가지...않는게...좋..을..겁..니다."
"그래, 그런데 입에 무엇이 들었나?"
"에엑..안..됩..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그 중 한사람이 하는 소리를 귀전으로 흘러 보내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뒤가 급했다. 창자가 뒤틀리는 소리가 나면서 금방이라도 설사가 나올 태세였으니까. 무얼 망설이겠는가! 자세하게 살펴 볼 계제도 없이 엉덩이를 손으로 누른 채, 예의 나무로 된 화장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 그때까지는 좋았다. 이젠 살았구나 싶었으니까.
변소는 온통 나무로 지은 아주 작은 내부였다. 그 나무 빛깔은 비바람을 맞아 짙은 회색빛으로 변색이 되었으며 좁은 공간에 발을 딛게 아래 쪽에 구멍이 나서 그 위에 올라서서 으례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밀고 앉아서 변을 보면 그만이었다. 그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좁
은 공간이지만 풀숲에서 용무를 볼 때처럼, 끝이 뾰족한 풀에 찔리는 것보다는 한결 나았으니까. 그런데, 웬걸? 내려 앉으려는 순간 지진이 난 것처럼 변소가 마구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어어-어!"
쓰러질 것처럼 흔들리는 벽을 붙잡고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상황을 보려고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작은 구멍에 주둥이가 삐죽한 검은 돼지가 발광을 떨고 있지 않은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영문도 모르고 아래에서 주둥이를 내밀고 변소가 흔들린 정도로 마구 비벼대는 돼지가 너무도 무서웠다.
"꿀꿀꿀..꿀!"
들어 올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바지를 내리고 앉으려는 순간, 머리를 밀어 넣으면서 요란하게 꿀꿀 거리는 것으로 보아 이건 예사롭지가 않았다. 바로 변기구 밑으로 돼지 머리가 툭 삘기져 나와 있고 마구 진동을 하는 것은 변소가 얹혀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낭패가 어디있단 말인가! 주저 앉아 변을 보기엔 돼지 머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렇다고 설사가 쏟아져 나오는 데 밖으로 뛰어 나갔다가는 바지가 온통 똥칠 일 것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일어서서 변을 보는 것이었다. 내려뜨린 바지춤이 버리지 않을 정도로 엉거주춤 일어서서 쏟아져 나오는 똥을 돼지 머리를 향해 갈겼으니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렇게라도 용무를 보고나서 황급히 넘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한 변소를 나와 버렸다. 그 안에서 돼지가 머리에 쏟아진 똥을 햘아먹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잘못하다가 귀중한 내 고추가 뜯길 판국이었으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오금이 다 떨린다.
"덜덜덜-"
그렇게 떨면서 앉아 있는데, 나와 마주 앉아 있던 다른 후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엉덩이를 주춤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 화장실이 어딥니까?"
"저 쪽 마당 끝이네...."하고 내가 턱끝으로 마당 구석진 곳에 있는 나무로 판자로 엉성하게 꾸며 놓은 변소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가 그곳으로 재빠르게 걸어 가고 있는 뒤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
-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쓴 글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6 |
3-11. 동굴(13)2007-11-13 07:55:45
| 文學 | 2009.02.01 | 4328 |
| 25 |
3-11. 동굴(13)
| 文學 | 2009.02.01 | 3862 |
| 24 | 3-11. 동굴(12)2007-11-13 07:53:50 | 文學 | 2009.02.01 | 4386 |
| 23 |
3-11. 동굴(11)
| 文學 | 2009.02.01 | 4546 |
| 22 |
3-10. 동굴(10) 김녕 해수욕장2007-11-13 07:50:48
| 文學 | 2009.02.01 | 4514 |
| 21 |
3-9. 동굴(9)
| 文學 | 2009.02.01 | 4433 |
| 20 |
3-8. 동굴(8)2007-11-13 07:47:28
| 文學 | 2009.02.01 | 4507 |
| 19 |
3-7. 동굴(7)2007-11-13 07:45:18
| 文學 | 2009.02.01 | 4446 |
| 18 |
3-6. 동굴(6)2007-11-13 07:43:26
| 文學 | 2009.02.01 | 4539 |
| 17 |
3-5. 동굴(5)
| 文學 | 2009.02.01 | 4513 |
| 16 |
3-4. 동굴(4)2007-11-13 07:39:32
| 文學 | 2009.02.01 | 4333 |
| 15 |
3-3. 동굴(3)
| 文學 | 2009.02.01 | 4641 |
| 14 |
3-2. 동굴(2)2007-11-13 07:35:17
| 文學 | 2009.02.01 | 4038 |
| 13 |
3-1. 동굴 (2007-11-13 07:32:54)
| 文學 | 2009.01.31 | 3679 |
| 12 |
2-4. 제주도의 똥돼지(4)(2007-11-13 07:30:56)
| 文學 | 2009.01.31 | 3426 |
| 11 |
2-3. 제주도의 똥돼지(3)
| 文學 | 2009.01.31 | 3197 |
| 10 |
2-2. 제주도의 똥돼지(2) 2007/11/13
| 文學 | 2009.01.31 | 2869 |
| » |
2-1. 제주도의 똥돼지 (2007/11/13)
| 文學 | 2009.01.31 | 3279 |
| 8 |
1-8.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2) 2007-11-13 07:18:37
| 文學 | 2009.01.31 | 2723 |
| 7 |
1-7.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 文學 | 2009.01.31 | 2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