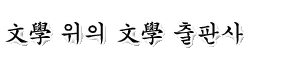|
|
|
--- |
|
文學위의 文學 출판사입니다. PDF로 전환하여 복사기로 책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인쇄'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제로보드 4.0의 일기(日記) 이곳은 '제로보드 4.0'에 있던 내용을 추출하여 되올린 곳인데... 간혹 게시판의 하단 내용에 이상이 생긴다. 그렇지만 봉사로 있다가 무려 6년만에 다시 눈을 뜬 것만 같다. 또한 글을 쓰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정도만해도 과분한 것 같다.
17. 양식기 제조 공장에서……(2)
2004.11.25 09:40

-수저를 일렬로 정열시켜 놓고 찝게로 문다-
앞에서 나래미를 놓는 일은 편했다.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혹사하지 않는 탓에 마술처럼 기술을 부려 제품을 정열 하여 집게를 물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래미를 놓는 것에 국한 하였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처럼, 조장으로서의 할 일을 그냥 접어 둔 채 한 사람 몫을 더 하고 있는 형편으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었다.
“오늘도 철야 작업을 해야겠어요. 수출 날짜가 있어서 클레임을 먹으면 큰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시를 하십시오!”
사무실에서 긴급 소집된 조장 회의에 반장은 황급히 말했었다. 그의 억양은 격양되어 있긴 해도 악의는 없었다. 누구보다 나는 반장을 믿었다. 6 개월도 되지 않은 나를 조장으로 세워준 것도 그였다. 그리고 조용히 나를 불러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쾌히 승낙하고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 경력으로 고래 힘줄처럼 버티고 있는 그가 안쓰러워 아낌없는 조언과 충성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오늘까지 철야 작업을 하면 벌써 삼일 째다. 완전히 몸은 녹초가 되다시피 한데 쉴 새가 없었다. 그저 반복적으로 몸을 놀릴 뿐이다. 사무실에 거울을 보았을 때의 얼굴은 온통 검은 빛이었다. 흰 살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검은 빛의 페인트로 도포를 한 것처럼…… 그나마 두 눈은 아직도 광채가 나는데 징그러울 정도다. 마치 밤 고양이라던가 호랑이의 두 눈처럼. 그것이 내 눈이고 내 얼굴이라고 믿기조차 어렵지만 몸이 피곤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가면 검은 먼지의 분진으로 이내 더러워지기 때문에 닦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나래미를 놓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집게가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바이스 뿌레이어와 같은 누름쇠가 세 개나 붙어 있는 집게를 벌려 제품을 물려고 하는데 장석이 떨어져 있어 물수가 없다. 그렇게 불량이 되어 던져 놓은 것이 벌써 네 개째다.
“어이! 앞에 와서 나래미 좀 놓아!”
나는 다음 사람에게 내가 하던 일을 맡기고 집게를 들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열었다.
눈부신 햇살이 충혈 된 눈을 뚫고 몰려들어 온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했다. 이젠,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너무나 눈부셔 현기증이 나는 것이다. 잠시 서 있다가 정문 옆에 있는 공무과로 뛰어 갔다.
“집게를 고치러 왔는데, 좀 고쳐줘요?”
공무과 안에는 쇠를 까는 선반(旋盤)기계, 밀링기계, 부레나 기계와 기어를 깎는 홉삥 기계가 무서운 쇠 빛과 초록의 페인트칠로 번쩍번쩍 빛을 내며 위치하고, 세 사람의 기술자들은 여유가 있고 한가롭게 내 눈에 비쳤다.
‘아, 얼마나 좋은 직종인가! 나는 쎄 빠지게 몸으로 부딪혀 일하는데, 저들은 그저 기술로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일하지 않는가! 세상에 저렇게 좋은 직업도 다 있다니……’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들을 흠모하고 질투했다. 아니, 그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 당시의 내 눈에는 그들이 내게 머나먼 꿈이요. 이상이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러면서 영원히 그들과 나와의 거리감은 너무도 절대적인 것으로 완전히 상반된 신분적인 차별을 갖게 하였고 그 차이는 내게 절망적인 고뇌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저들은 갖고 있었으며, 내가 그들처럼 편하게 생활하고 기술을 배우려는 시도는 너무도 어리석은 것으로서 적어도 그 당시의 내게 있어서 여기 광연마는 벗어날 수도 없는 천직이며 도저히 다른 직종의 선택과 모험은 생각해보지도 않은 문제였기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거기 놓고 가!”
그들이 내가 급한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이 야속했다. 갖고 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기 들이 하던 일이 있다고 그걸 마무리 짖고 해주겠다고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다른 때 같으면 기다렸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삼 일 째 철야 작업을 하여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녹초가 되기 일보 직적이었다. 저희들은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헤아리기나 할까 싶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공무과 앞에 앉았다. 그리곤, 집게를 그곳 바닥의 철판 위에 놓고 용접기 고대(용접봉을 무는 것)를 집어 들고 그들이 보건 말건 지졌다.
“지지-직!”
밝은 빛의 광채가 번쩍 일어나며 눈앞이 컴컴하다.
“자, 이걸 써봐!”
내가 잘 아는 공무과 윤기사가 내게 용접할 때 쓰는 검은 유리가 달린 마스크를 건네준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아 와서 잘 아는 터였다. 그 유리 안으로 불꽃이 일어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용접봉을 갖다 대었더니 너무나 잘 보였다. 눈이 아프지도 않다. 그렇지만, 용접하려는 부위가 자꾸만 벗어난다.
“허허-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잘 봐! 이렇게 경사지게 들고 밀어 내듯이 가까이 대면서 서서히 내리는 거지.”
내가 하던 용접 고대를 뺏어들고 윤기사가 용접을 해 준다. 다른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지라 나는 얼씨구나 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처음 해 본 용접이었다. 그 뒤로는 곧잘 용접을 직접하곤 했다. 목마른 놈이 물을 마신다고……
~~~~~~~~~~~~~~~~~~~~~~~~~~~~~~~~~~~~~~~~~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넘어가야했던 순간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른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6 |
26. 내 손으로 건물을 짓다.(3)
| 문학 | 2004.12.05 | 3382 |
| 135 |
나의 컴퓨터
| 문학 | 2004.12.03 | 3586 |
| 134 |
25. 내 손으로 건물을 짓다.(2)
| 문학 | 2004.12.02 | 3329 |
| 133 |
24. 내 손으로 건물을 짓다.
| 문학 | 2004.12.01 | 3142 |
| 132 |
지은희 장관 연세대 특강서
| 문학 | 2004.11.29 | 3165 |
| 131 |
23. 날고 있는 오리 사진을 찍기까지(2)
| 문학 | 2004.11.29 | 3074 |
| 130 |
22. 날고 있는 오리 사진을 찍기까지……
| 문학 | 2004.11.29 | 3121 |
| 129 |
21. 오리의 세계
| 문학 | 2004.11.27 | 2970 |
| 128 |
20. 무당이 굿을 한다.
| 문학 | 2004.11.26 | 2929 |
| 127 |
19. 비애(悲愛)
| 문학 | 2004.11.25 | 2748 |
| 126 |
18. 양식기 제조 공장에서……(3)
| 문학 | 2004.11.25 | 2758 |
| » |
17. 양식기 제조 공장에서……(2)
| 문학 | 2004.11.25 | 3064 |
| 124 |
16. 양식기 제조 공장에서……
| 문학 | 2004.11.25 | 3639 |
| 123 |
15. 아, 내 사랑 선영이여! (2)
| 문학 | 2004.11.25 | 2818 |
| 122 |
14. 아, 내 사랑 선영이여!
| 문학 | 2004.11.25 | 3007 |
| 121 |
13. 사랑의 춤
| 문학 | 2004.11.24 | 3182 |
| 120 | 11. 왕따오리3 | 문학 | 2004.11.21 | 3146 |
| 119 |
10. 왕따오리2
| 문학 | 2004.11.20 | 3096 |
| 118 |
9. 왕따오리
| 문학 | 2004.11.20 | 3068 |
| 117 |
오산과 발안사이 정관에서...
| 문학 | 2004.11.18 | 3187 |